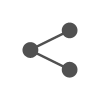사라진 시간을 찾아서
조경민
분량3,613자 / 10분
발행일2016년 11월 14일
유형오피니언
어린이의 평균 야외생활, 하루 7분
사람이 사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자 가장 중요한 행위가 일, 놀이, 휴식이다. 행복해 보이는 나라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즐겁게 놀고, 잘 쉰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은 쫓기듯 일하고, 놀 곳이 부족하고, 쉴 시간이 없다. 이유가 뭘까?
장시간 노동으로 워낙 유명한 나라이니 달리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나빠 보인다. 노동계의 오랜 논쟁 중의 하나가 근무시간을 회사 정문을 통과한 시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작업장에서 일을 시작한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야 그게 뭐가 중요한가 하겠지만 3만 명이 근무하는 중공업 회사라면, 거기에 정문에서 작업장까지의 거리가 30분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러한 논리를 확정해서 출퇴근 교통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판례가 반증하듯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 시각부터 퇴근 후 집에 갈 때까지가 일을 위해 소비한 시간이라고 본다면, 출퇴근에 보내는 시간이 세계 최고인 우리는 어쩌면 하루의 절반을 일로 보낸다고 봐도 좋겠다.
놀 곳이나 놀 거리가 부족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며, 더 중요한 것은 놀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공부에, 어른들은 일과 자기계발에, 노인들은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 더 최악인 것은 놀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다. 놀아달라는 자녀들의 등쌀에 OO랜드, OO월드에 가면서 밀리는 차 안에서 느꼈을 짜증들을 생각해보면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골목을 차에 뺏긴 이후 우리 아이들이 야외에서 노는 시간이 하루 평균 7분이라는 통계는 미래를 어둡게 한다.
한국에서 쉴 시간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배부른 소리로 들릴지 모른다. 일요일에 잠만 자는 아빠로 인한 불만은 보편적인 것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잠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쉼의 다른 요소인 여행은 어떤가? 연휴만 되면 인천공항 출국장에 사람이 넘치고 모든 고속도로가 막히고 관광지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것도 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핸들을 놓게 하는 방법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답은 뜻밖에 간단한 곳에 있다. 로컬이 무너진 탓이다. 집에서 너무 먼 곳에서 일하고, 집 근처에 놀 곳이나 쉴 곳이 없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다. 진단은 쉬울 수 있지만 해법은 늘 그렇듯 쉽지 않다. 하지만 엉킨 실의 끝을 찾고 망가뜨린 시간만큼의 공을 들여 하나하나 풀어간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첫째, 광역 도시계획에서 지역 도시생태계 중심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어디에 살든 10분 안에 공원을 갈 수 있게 한다는 ‘10분 거리 프로젝트’로 유명한 독일은 이제 그 10분을 5분으로 쪼개어 더 세밀하게 도시를 기획하고 있다. 5분 거리 안에 공원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만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것이다. 가까운 곳에 갈 데가 있고 즐길 데가 많다는 것은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요한 요소다. 교통체증을 감소하기 위해 도로를 넓히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체증이 증가한다는 ‘브라에스의 역설’에서도 드러나듯이 차로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고 넓어진 공공공간을 시민들의 쉼터나 놀이의 장소의 활용하는 것은 미래도시의 필수 요소다.
둘째, 길을 바꿔야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사업 중에 가장 허망한 것이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보행친화를 가장한 상가활성화 사업에 다름 아닐 뿐 아니라 그냥 걷기도 힘든 거리환경에서 걷고 싶게 만든다니 어불성설이다. ‘걷고 싶기’ 이전에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모든 사거리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둔다거나 신호주기를 짧게 하여 보행성을 높이거나 보행방해물을 지하화하는 등 아주 기본적인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서울역고가를 설계한 네덜란드 건축가 그룹 MVRDV의 위니 마스Winy Maas가 서울시와 경찰청과의 협의 당시, 위니 마스는 차량 속도를 줄여 사고도 줄이고 보행편의도 높일 수 있는 횡단보도를 많이 만들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법률상 횡단보도 설치장소에서 200m 안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고 서울시와 경찰청이 난색을 보이자 위니 마스가 어리둥절해 하던 표정이 생각난다. 차량의 흐름을 막지 않기 위해 횡단보도를 만들지 못하는 현 수준에서, 런던의 ‘엑시비션 로드’나 ‘컴플리트 스트리트’를 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평균 30-50m 안에 횡단보도가 있고, 현재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도로를 혼용하는) ‘공유도로(Shared Street)’ 정책으로 횡단보도가 필요 없는 거리로 가는 중이다.
셋째, 대중교통체계의 혁신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천만 명이 넘게 움직이는 서울 같은 메트로폴리탄에서는 걷는 생태계만으로는 도시를 소화하기 힘들다.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지하철 체계를 갖추고도 모두가 차를 끌고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가기 편하게 대중교통이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새 가장 화젯거리인 도쿄의 츠타야 서점을 예로 들어보자. 이 서점의 가장 큰 특징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르별 진열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별로 책을 진열한다는 데 있다. ‘먹방’ 열풍이 뜨겁다면 음식이 주제인 소설과 음식 문화에 관한 인문학 서적, 요리책이 한 코너에 있는 식이다. 소비자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기본 명제를 실천한 것뿐인데 매출은 급성장하고 서점은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 되고 있다. 요새 모든 정책의 필수아이템이라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중교통의 재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미국의 포틀랜드는 대중교통 체계의 혁신을 바탕으로 통행거리를 20% 감소해 총 26억 달러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26억 달러에 달하고, 미국 평균의 다섯 배에 이르는 젊은 층의 유입 효과도 거뒀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노선을 조정한다면, ‘지구가 무너져도 차를 끌고 나오겠다’는 사람들을 제외한 많은 이들이 핸들을 놓을 것이다. 이제는 버스중앙차로, 트램, 복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하드웨어시스템을 넘어, 소비자 중심의 ‘휴먼웨어’ 시스템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다.
몸으로 사는 사람들
“사람은 삼분의 일을 자고 삼분의 일을 일하고, 나머지 삼분의 일은 걷습니다” 라고 했던 대만의 리첸 린 레전드린 댄스시어터 예술감독의 말과, “걷는다는 것은 잠시 동안 혹은 오랫동안 자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숲이나 길, 혹은 오솔길에 몸을 맡기고 걷는다고 해서 무질서한 세상이 지워주는 늘어만 가는 의무들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덕분에 숨을 가다듬고 전신의 감각들을 예리하게 갈고 호기심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걷기 예찬』의 저자 다비드 르 브르통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개장을 7개월여 앞둔 ‘서울역고가프로젝트’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11개의 신호등을 건너 30분이 걸려 남대문시장을 가던 서울역 뒤편의 사람들이 이제는 10분 만에 매력적인 공중정원을 걸어 장을 볼 수 있다는 데 더없는 매력을 느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낀 시간과 느낀 감성이 망가진 도시를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조경민
조경민이라는 이름보다는 조반장이라는 별명이 더 익숙하다.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걷고 싶은 길을 발견하고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단법인 서울산책의 대표로 일하는 중이다.
사라진 시간을 찾아서
분량3,613자 / 10분
발행일2016년 11월 14일
유형오피니언
『건축신문』 웹사이트 공개된 모든 텍스트는 발췌, 인용, 참조, 링크 등 모든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용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의 출처 및 저자(필자) 정보는 반드시 밝혀 표기해야 합니다.
『건축신문』 웹사이트 공개된 이미지의 복제, 전송, 배포 등 모든 경우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