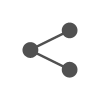공공이라는 이름의 민주주의
김상호
분량2,355자 / 5분
발행일2025년 1월 10일
유형서문
자유와 행복, 평화와 안전, 헌법과 질서, 민주주의. 2024년 12월 우리 몸과 마음에 매일매일 새겨넣은 한마디 한마디다. 국회의사당, 국민의힘 당사, 헌법재판소를 에워싸고 밤낮 울려 퍼진 시민들의 맹렬한 외침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그저 공기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라 힘겹게 쟁취해낸 것이었다는 각성과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뉴스창을 수시로 새로고침하게 하고 종일의 피곤을 짊어지고 광장으로 나가게 만들었다.
건축이 오랫동안 말해온 ‘공공’이라는 가치 속에도 모두의 자유, 평등, 행복, 안전, 질서를 추구하길 바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사회의 일반 구성원에게 공동으로 속하거나 두루 관계되는 것’이라는 밋밋한 뜻의 공공이라는 말은 사실 별로 재미없고, 잘 나아지지 않고, 좀처럼 티가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의 안녕을 묻고 반복되는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상기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비인기 포럼인 <당선작들, 안녕하십니까>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같은 이유다. 작년(2024)에는 좋은 결과에 이른(혹은 이를 것 같은)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그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졌는지 살펴봤다. (이 기록도 올해 조만간 정리되어 공유된다.) 포럼의 초점을 잠시 돌렸던 것은 지난 3년, 15회, 18개 프로젝트 이야기 속에서 공공건축이 똑같이 겪는 고질적 문제와 구조적 한계를 매시간 보고 들으며 쌓인 피로감을 한 번 털어내기 위함이었다. 많은 이의 각고 끝에 가끔 좋은 결과를 얻고, 그 성과와 보람을 알리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우리 공공건축을 위해서는 초점을 다시 원위치시켜 당선작들의 경로를 추적, 점검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과정의 작더라도 유의미한 개선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당선작들, 안녕하십니까>를 처음 시작할 때 이 포럼이 공공건축의 경로를 그저 뒤쫓기만을 바라진 않았다. 열린 논의와 토론을 지렛대로 삼아 잘못된 경로로 들어서기 전에 바로잡고, 뻑뻑한 제도와 낡은 관행을 협의를 통해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랐다. 나아가 해마다 새로 지어대는 수많은 공공건물이 정말 다 필요한 것인지, 모두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공공건축의 소식과 정보를 찾고, 참여 주체들을 섭외하고, 발제와 토론을 준비하고, 포럼 자리를 여는 동안 마주한 현장은 앞뒤가 벽으로 막힌 가운데서 공회전하는 불합리와 부조리의 늪 같았다. 처음의 바람이 순진하고 비현실적이며 이상적이라는 것을 몰랐던 바 아니지만, 이렇게 연전연패하리라고는, 이렇게 상자 속에 갇혀 덜그럭거리기만 할 거라고는 생각 못/안 했다.
이번 39호 『당선작들, 안녕하십니까 2023』에는 천년의 문,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강감찬도시농업센터, 노무현시민센터, 이렇게 다섯 프로젝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다. 천년의 문은 2023년 초에 불거진 서울링 사건으로 느닷없이 재소환된 지난 세기말 국가 프로젝트의 어둡고 힘겨운 시간을 복기한다. 예나 지금이나 공공건축이 지나는 경로는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다. 등촌동 어울림플라자는 처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울려 각자의 일상을 영유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장애인의 공간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상하리만치 비정상적으로 왜곡되고 차별받는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허술한 심사와 비현실적인 예산과 기술의 피상적 이해가 공공건축을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밀고 가는지, 건축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강감찬도시농업센터는 공모 당선작은 아니지만 적절한 기획과 상호신뢰 속에 태어난 성공적인 공공공간으로, 우리는 이런 공공건축을 또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한줄기 희망의 빛을 남긴다. 노무현시민센터는 반(준) 공공건축으로 시민에 의해 향유되는 진정한 공공성의 공간은 어때야 하는지, 또 어떨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을 남겼다. 물론 여기서도 당선작이 걸었던 경로는 어김없이 암초와 장벽 투성이었지만.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건축가의 헌신이나 희생 없이 세워진 것은 없다. 그것은 필요한 것일 수는 있지만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상을 좇고, 퇴보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겨 본다. ‘건축의 공공성’이라는 기치가, ‘건축과 사회’라는 연결 쌍이, ‘건축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말이, ‘사회를 담는 건축’이라는 수식어가 무의미한 관용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공공건축 당선작들의 안녕을 계속 묻고, 바라고, 도우려 한다.
김상호 건축신문 편집장
공공이라는 이름의 민주주의
분량2,355자 / 5분
발행일2025년 1월 10일
유형서문
『건축신문』 웹사이트 공개된 모든 텍스트는 발췌, 인용, 참조, 링크 등 모든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용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의 출처 및 저자(필자) 정보는 반드시 밝혀 표기해야 합니다.
『건축신문』 웹사이트 공개된 이미지의 복제, 전송, 배포 등 모든 경우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