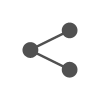틀과 평면
서승모
분량4,492자 / 9분 / 도판 1장
발행일2023년 4월 18일
유형인터뷰
평면 구성과 어프로치 디자인
4년 전 『공간』 특집 기사에 내가 평소에 많이 고민해온 작업 주제들을 글과 작업으로 엮어서 실었다. ‘땅’, ‘입면’, ‘적층’ 등 모두 미학적 태도를 견지하는 이야기들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건축을 그 속에서 설명했는데, 중요했던 포인트는 서양 건축과 동양 건축의 차이다. 서양 건축은 단면적이다. 전통적으로 조적식 구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면을 만들어낸다. 동양 건축은 가구식 구조라서 사실상 입면이라는 게 없다. 보와 기둥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문과 창이다. 일본 건축에서도 입면을 중시하지 않는다. 유럽과 달리 창을 예쁘게 뚫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다. 나도 그렇다. 그래서 나는 내 건축을 ‘평면을 적층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각기 다른 형식의 평면을 적층할 뿐 (입면의) 디자인이나 비례는 만들지 않는다. 그것이 내겐 중요한 ‘방향’이다.
주택이든 근생이든 평면이 프로그램을 담기 마련이고, 그래서 명쾌해야 한다. 평면을 구성할 때는 땅과 골목이 개입하게 된다. 서양 건축에서는 건물이 대지 경계에 꽉 차게 들어서지만, 동양 건축에서는 건물이 분동되기도 하고, 관문을 통해 진입하는 형식을 띠기도 하면서 영역 내에서 공간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 대지 경계에서 건물에 이를 때까지 사이 공간을 많이 만들기도 한다. 서양 건축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런 ‘어프로치 디자인’도 내 건축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이런 몇 가지 원칙 위에서 건축주의 요구 조건과 주변 상황을 풀어나간다.
특히, 상업 건물에서는 테넌트(혹은 거주자)가 중요하다. 조금 더 일반화하면, 테넌트의 공간과 도시가 만나는 중간 영역의 디자인이 중요하다. 거기에 ‘어프로치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건물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테넌트와 도시를 연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동안 주택 작업을 주로 해오다 보니 이런 관심과 생각을 강하게 내세울 기회가 적었던 것일 뿐, 건축에 대한 생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하지 않았다. 성수동 LCDC 작업 후에 많이 받은 질문도 주택 작업을 주로 해오다가 상업 건물을 설계할 때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 하는 것이었다.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주택이 일상의 배경이 되는 곳이라면 LCDC 같은 건물은 비일상의 배경이 되는 곳일 뿐이다. 약간 더 자극적인 부분이 몇 군데 추가된 정도다. 그마저도 형태적 디자인보다는 스케일과 동선에 대한 것이다.
입면에 대한 물음에 대해
(이종건 교수는 2018 가을 『건축평단』에서 평면의 우위로 인해 수직성이 이차적인 것이 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평면과 수직면은 통합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지면에 남겼다.) (오늘 그 얘기를 다시 물었으니 답하자면) 평면에서 중요한 것은 선이 아니라 선들 사이에서 일어날 행위를 상상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시퀀스’라고 부른다. 사람의 움직임을 가이드하는 평면의 선은 중요하고, 거기에는 당연히 수직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평면을 적층할 때 그 수직면을 하나로 통합할 이유가 내겐 없다. 수평면의 선이든 수직면의 선이든 어떨 때는 시각적으로 중요하기도 하고 시퀀스를 유발하는 데 중요하기도 하다. 어느 한 쪽이 언제나 우선될 수는 없고, 상대적 비중이 그때그때 바뀐다.
입면에 사회성을 담으려는 노력은 한다. 하지만 입면을 디자인하는 방식은 아니다. 예를 들면, 최근 옥인동에 짓고 있는 근생에서는 층과 층을 이어주는 공간인 계단실을 열심히 디자인했다. 계단실 자체가 전체적으로 힘을 갖게끔 하고 계단실의 구조가 건물 전체 구조를 잡아주게끔 설계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들어가는 근생의 속성에 맞춰 최대한 ‘투명하게’ 정돈했다. 주택은 투명하게 다 열 수 없으니 개구부를 뚫는 경우에는 옆집과의 시선을 적절히 처리하는 식으로 계획한다. 검붉은 타일로 마감한 옥인동 주택처럼 주변 건물에 쓰인 재료들을 고려해 외장재를 선택하기도 한다. 입면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최원준 교수는 2019.4 『공간』 특집에서 건물 입면의 사회성을 강조하면서, “입면 구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사무소효자동의 작업들에서 보인다고 썼다.) ‘구성’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비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반면 ‘적층’은 평면의 유형이 그대로 얼굴로 드러나야 한다. 1, 2, 3층이 제각각 다른 얼굴이 될 수 있다. 평면으로부터 따라오는 필연적인 입면이 적층되는 방식이므로, 그런 점에서 ‘자유로운’ 입면보다는 ‘자율적인’ 입면에 가깝다.
하남 미사 주택(M하우스)의 입면은 매스를 만들고 나서 입면을 그리는 방식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야심작 프로젝트의 엘리베이터와 계단도 입면을 그리려고 할 때와는 다른 태도다.) 각각의 자율성이 모여서 ‘뭔가’가 된 상태다. 입면의 결과는 각 내부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상상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행위를 유발하는 평면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회성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다. 각각의 개별성을 도드라지게 만들고, 그것이 모여서 사회성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집에 거실이 있다고 단란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용공간을 예쁘게 만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공동생활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다.
—
(이종건 교수는 2018 가을 『건축평단』에서 사무소효자동의 작업이 ‘삶과 개념 간의 균형’, ‘집과 건축의 통합’을 화두로 던진다고 보고, ‘미의 산업이 생활세계를 식민화한 상황에서 건물의 마감은, 외관은 어떤 미학을 좇아야 옳은가?’라고 질문했다.) 건물의 마감이나 외관이 미학을 좇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보자르나 벨빌 같은 교육에서는 건축을 만들어내는 자체적 논리가 있지만, 나는 그런 걸 배우지 않았다. 내가 배우고 익힌 건축은 ‘민예’에 가깝다. 삶이나 (비)일상을 면밀히 살펴 그 배경을 만들다가 나온 것이 지금 내 건축인 것 같다. 민예품은 생활의 쓰임을 위해 만든 것이 어느 순간 고유의 가치를 띠게 된 것인데, (내 건축은) 거기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럴싸한 말로 설명할 필요 없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 나온 결과들이다.
일본 유학파
계열이나 계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은 당연히 한다. 그런데 한국에는 계열, 계보라는 것이 생기기 어렵다. 계열과 계보는 학문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일본에 ‘학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학교마다 건축을 가르치는 것이 달랐고, 거기서 배운 그룹들이 서로 다른 방식과 태도로 건축 작업을 하다 보니 그네들끼리의 이야기가 생긴 것이다. 한국은 이런 학파가 없기 때문에 계보를 말하기 어렵다.
‘포지셔닝’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는다. 자리라는 것은 자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남이 정해주는 것이다. 어렸을 땐 전략적 포지셔닝을 생각하곤 했는데 부질없는 것 같다. 지금 내겐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 나는 지금에 충실한 스타일이다. (그래서 사무소 운영에 대한 타임 리미트 같은 것도 정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다. 물론 계획은 한다. 연 매출 계획이나 개별 프로젝트의 수행 계획은 당연히 있다.)
‘위치’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 내 위치는 우리 세대(내 동년배)에서 유일한 일본 유학파 정도일 것 같다. 내 뒤로는 오헤제 정도가 있다. 일본 유학파의 특징 중 하나는 중간 영역이나 틈에 대한 관심이다. 소셜 영역을 생각하는 건축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나는 생각은 있지만 그런 종류의 작업을 할 기회가 별로 없다. 다세대주택 설계 의뢰가 딱 한 번 들어온 적이 있고, 그 뒤로는 아직 없다. 아쉽다.
일본에서 건축을 배운 탓에 나는 디자인(소위 스키매틱 디자인)을 해서 스태프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어렴풋한 형태는 있겠지만, 계속 언어로(이야기로) 설계를 풀어나간다. 그다음은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한 치수, 스케일감, 비례를 물으면서 나아가지만, 계속해서 되묻는 것은 설계의 큰 틀이 작동하기 위한 실제 크기와 거리가 얼마냐 하는 것이다.
나는 뭔가를 계속 빼내는 식으로 작업한다. 발산과 수렴을 되풀이하는 동안 계속 깎아내서 초기 생각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틀을 먼저 잡는다는 생각으로 늘 작업한다. 다른 건축가들과 다른, 변별성 있는 틀을 잡되,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그 틀은 잘 읽히지 않게 만든다. 명쾌한 기하학적인 선이 건축을 다이어그램처럼 읽히게 만드는 방식도 있지만, 다이어그램 상태가 그대로 건축으로 직역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그것을 배경 속으로 숨기려고 노력한다. 완성했을 때는 건축적 생각이 한 번에 안 읽히게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너무 쉽게 읽히면 재미없는 건축이 된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숨어 있는 육수이듯, 전체 건축의 틀도 그렇게 숨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사무소효자동 작업에서 형태가 눈에 띄는 경우는 잘 없다. 사진에도 건축의 형상은 잘 안 잡힌다. 공간을 경험하는 중간에 은근슬쩍 느껴지게 하고, 개념은 지워진(가려진) 상태를 선호한다. 공기처럼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것이 깊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이 서승모 / 인터뷰어 김상호 / 원고화 및 편집 김상호
틀과 평면
분량4,492자 / 9분 / 도판 1장
발행일2023년 4월 18일
유형인터뷰
『건축신문』 웹사이트 공개된 모든 텍스트는 발췌, 인용, 참조, 링크 등 모든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용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의 출처 및 저자(필자) 정보는 반드시 밝혀 표기해야 합니다.
『건축신문』 웹사이트 공개된 이미지의 복제, 전송, 배포 등 모든 경우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