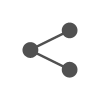거실 안, 밥상 앞의 혁명 조직
최빛나 × 박가희
분량9,201자 / 20분 / 도판 3장
발행일2015년 1월 15일
유형인터뷰
네덜란드 주거 관련 예술기획과 정책 _ 거주 공간은 안전함과 편안함을 지향하며 지루한 공간이 무한 반복된다. 대부분은 사적이고 보수적인 공간에 거주하고, 이에 불안을 느끼는 이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발언의 계기로 삶의 공간을 실천의 무대로 삼는다. 하지만 대안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공간의 등장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 있는 현대미술 및 디자인 연구소인 카스코Casco의 최빛나 디렉터 인터뷰와 건축 칼럼니스트 배윤경의 글을 통해 몇몇 주거 관련 프로젝트의 교훈을 들어봤다.
최빛나 네덜란드 내 공공미술기관인 Casco(Office for Art, Design and Theory)의 디렉터로 제도비평institutional critique의 새로운 지평, 공동체와 공통의 것the commons, 예술과 사회운동의 관계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형식의 예술적 실험 및 리서치, 그리고 조직화organising에 주안을 두고 있다.
인터뷰어 박가희 주로 리서치를 기반으로 역사와 현상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관심이 많으며, 전시를 통한 (대안적) 지식생산의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로 재직 중이다.
박가희 《협력적 주거 공동체Co-living Scenarios》 전시를 준비하던 중 구보타 히로유키가 『셰어하우스: 타인과 함께 사는 젊은이들』에서 네덜란드 스쾃을 공동주거의 한 형식으로 소개한 것을 보았다. 스쾃이라고 하면 정치적 함의나 저항의 의미를 지닌 ‘무단 점거’의 인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스쾃은 법적 배경이나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과 정서 면에서 일상과 가까운 듯 보였고, ‘공동 주거’ 개념에 더 가까운 듯하다.
최빛나 스쾃의 권리는 주거한다는 조건에서 보장되었다. 스쾃을 하는 건물이 1년 이상 비어 있고, 건물 소유주가 향후 6개월 이내 건물의 사용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증명할 수 없으며, 끝으로 스콰터가 이 건물에 실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때 법적 제재 없이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스쾃의 정치적 함의가 그렇게 매끈한 것은 아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주택 보급량이 수요에 한참 못 미친 상태에서 스쾃은 지극히 실용적인 선택이었고, 70년대에 들어서야 대안적 삶의 양식이자 공동 주거의 한 실천으로 등장한다. 이때 스쾃공동체community 내 사람들은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펼쳤다. 예를 들어 반핵운동과 여성주의 운동에 참여했고, 채식주의자도 많았다. 이들의 활동은 오늘날 잘 자리잡은 여러 문화예술 기관이 스쾃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에 대한 보편적 권리을 확고히 하고, 사유재산 혹은 자본축적의 도구로서의 주거를 문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주거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실천은 반자본주의적이고 반권위적 문화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유의미하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 스쾃의 비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들기 시작했다. 주류 매체들은 스쾃이 기회주의적이며 자기 자신과 이웃에 무책임한 삶의 양식이라며 비판하기 시작했고, 스쾃 공동체 내에서도 자기 반성적인 기류 혹은 분열적인 양태가 등장했다. 이러한 단면은 2011년 문화인류학자 나지마 카달Nazima Kadir의 박사과정 연구가 그 정점을 찍는데, 그는 암스테르담의 한 스쾃 공동체에서 3년 넘게 머물며 이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다이나믹의 대안성을 연구했는데, 지극히 회의적인 결론을 내렸다.
박가희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대한 회의였나?
최빛나 스쾃 공동체의 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라든가 내부 정치, 사회적 관계, 공동체성 전반에 걸친 회의다. 대표적으로 그들 내에서도 가부장제가 유지되고 있었고, 외부인 혹은 이질성에 대한 포용의 정도가 기존의 다른 공동체와 별 다를 바 없었다. 이러한 그의 비판은 분명 스쾃 공동체에 논란을 일으켰는데, 일종의 동종요법으로 수용되기도 했다. 우리는 이 논란이 된 연구가 스쾃 공동체와 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2010년 말 실효화된 스쾃 전반의 불법화라는 현실에 대한 지속적 응답, 행동, 담론 등이 절실했다. 그래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시트콤 형식의 <우리의 자율적 삶?Our Autonomous Life?>이다.
박가희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나?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 스쾃에 대한 논의가 더 발전되고 이후 확산되었는지도 궁금하다.
최빛나 <우리의 자율적 삶?>은 2009년 10월부터 시작한 《대가사 혁명The Grand Domestic Revolution – User’s Manual》(GDR로 약칭)의 일환으로 진행한 ‘협동시트콤’이다. GDR은 당시 위트레흐트의 소셜 디자인 비엔날레로부터 공공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고안한 장기 프로젝트다. 기존의 많은 소셜 디자인 담론이 사회적 시스템이나 구조에 대한 고찰 없이, ‘이타성’과 국부적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일종의 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동시에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라는 유명한, 그러나 오해도 많은 서구 여성주의 운동의 명제를 방향타로 삼았다. ‘지금, 여기, 자신의 공간’에서 사회, 정치적인 구조가 문제적으로 작동하는 지점들을 선별해내고, 나아가 ‘집’이라는 공간을 공동체성, 혹은 공동을 위한 하나의 거점이자 도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려 했다. 이때 거의 계시와도 같이 프로젝트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방법론에도 큰 영향을 준 도시역사학자 돌로레스 헤이든Dolores Hayden의 책을 헌책방에서 발견했다.1 이 책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여성주의자들이 공동 가사, 육아 노동, 주거 운동을 이끌어 내고 이에 적합한 주거 및 도시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책은 19세기 미국 동서부 여성주의자들의 공동 가사, 육아 노동, 주거, 그리고 그에 적합한 공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 프로젝트는 그로부터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유럽에서의 ‘대가사혁명grand domestic revolution’의 문제점과 방법에 대해 묻는다. 카스코 근처의 30평 정도 되는 1일 주거형 아파트를 빌려 함께 리서치할 작가 및 디자이너 등을 중/단기 레지던시에 초대하고 아파트를 개조하기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의 다른 의미심장한 측면은, 프로젝트가 당시 두 개의 사회적 현안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이다. 하나는 앞서 얘기한 스쾃 실천의 범죄화와 범죄화에 반대하는 데모들이고, 다른 하나는 2006년 이후 서서히 준비되었다가 마침내 점화된 가사 노동자를 포함한 청소노동자조합의 파업 및 지속적인 투쟁이다. 90년 중반 이후로 네덜란드 연립정부는 점차 우경화되어 왔고,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제를 최선의 가치로 하는 정당 VVD Volkspartij voor Vrijheid en Democratie이 최다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스쾃은 ‘자연스럽게’ 철폐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양성평등화와 사회 전반의 경제화 과정에서 청소나 가사 노동은 불가피한 최하위 노동으로 대다수 ‘남쪽Global South’의 이주노동자에 의해 실행되는데 이들의 노동과 생활 여건의 열악함은 물론 노동자로서의 인정 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프로젝트의 주거/가사의 공간에 대한 고찰, 그리고 이에 대한 개입을 사회 변화 및 운동과 어떤 연관 없이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율적 삶?> 역시 스쾃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방식을 도모했다.
박가희 거대한 정치적 함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공유하는 방식을 보면, 정치적 성향을 전면에 내세우기를 일부러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에서 시작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정치/사회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저변에 깔린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정치적 방향이 너무 뚜렷하면 다루는 이슈 또한 편향될 수도, 또 왜곡될 수도 있지 않을까.
최빛나 우선, 정치적 성향을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다. 물론, 미술 실천의 장, 그리고 공공미술 기관의 입장에서 정치적 일색을 표명하는 것에 대한 숙고는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입장의 표명을 피한다기보다 그 모호성을 일종의 전략으로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가희 일상의 사소한 변화 혹은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에서 출발해 사고와 가치관에 변화를 줄 때 결국 큰 틀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간섭으로 이슈에 접근한다고 이해해도 되겠나?
최빛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뉘앙스가 필요하다. 최근 출판한 『GDR Handbook』에 실린 그리스 건축학자인 스타브로스 스타브리데스Stavros Stavrides의 에세이를 예로 들어보겠다. 그는 공동체를 실천하는 도시와 주거 운동을 고찰하면서 사회 운동에 있어서 ‘움직이는 사회a society in movement’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2 그는 공동체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연대를 가치화하는 대신, 일상에서 출발해 자발적으로 점진적으로 연대를 이루는 것에 주목한다. GDR이 취한 방식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카스코가 GDR 이후 설정한 의제 “공통의 것 만들기Composing the Commons”와 관련 리서치를 통해서 특히 마리나 비슈미트Marina Vishmidt의 에세이 「모든 것은 유니콘이 될 것이다」를 통해, 다시 한번 경각하게 된 것은, 작은 공동체적 실천은 사유재산에 대한 대립적 사고와 움직임 없이는 법과 같은 제도와 권력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목적을 위한 수단 및 과정을 희생하는 것에 대한 번민이나 회의가 중요하고, 취하려는 언어가 하루 아침에 습득되지 않듯, 그렇게 지속적인 연습과 익숙해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속의 즐거움과 행복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다. 하지만 과정과 작은 실천에만 안주할 수는 없다. 사회 최전방에서 벌어지는 급진적인 일들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해야 하고, ‘움직이는 사회’의 현 지배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한 함의와 저항성, 그리고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투쟁’이나 상실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가희 <우리의 자율적 삶?>이 취한 입장이 궁금하다. 픽션을 연기했다기 보다는 스쾃 공동체에 실제 일어났거나 일어날 법한 일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최빛나 대본은 나지마 카딜의 박사논문에 기초했고, 실제 스콰터가 인정할 만한 사실주의에 기초한 것은 맞다. 하지만 시트콤이라는 형식을 예술에서 취할 때는 시트콤에 전형적인 아이러니를 다시 한번 틀어 보기를 의도했다. 또 이 시트콤을 위해 모인 공동체도 한시적으로 함께 하며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실주의는 –굉장히 현실적인 스테레오타입을 포함해서- 반현실주의를 위한 전략에 가깝다. ‘반현실’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한 일시적 공동체는 공개 모집을 통해 스콰터와 스쾃의 경험이 있거나 공동 주거 및 집단 행동에 관심이 있는 미술작가와 디자이너 5명, GDR협력 큐레이터 마이코 타나카Maiko Tanaka와 인턴, 우리가 초대한 나지마 카딜, 그리고 스쾃은 물론 공동연극의 퍼포머 마리아 파스크가 함께 했다. 그들은 대본은 물론 전 제작 과정을 함께 꾸려갔다.
박가희 GDR로 인해 파생된 양상이 궁금하다. 프로젝트가 진행된 시기와 스쾃의 불법화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활발하던 시기가 일치했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들과 같은 시기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간에 간극이 있었을 것 같다.
최빛나 안타깝게도 퇴거된 스콰터들과 (한국에서도 근래 많이 논의되었 듯) 불안정한 삶을 사는 젊은 문화생산자 및 작가들의 삶 사이의 간극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 가령, 2008년 미국에서 있었던 주택 대출 문제와 더불어 촉발된 재정위기와 유사한 흐름 속에서 네덜란드도 1980년부터 넉넉한 융자보조비를 제공하면서 부동산 소유를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90년대 90%에 육박했던 소셜하우징이 현재는 70%까지 하락했다. 값싼 월셋 집이나 방은 점점 줄고, 집을 소유하는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빚을 떠안았다. (지난 몇 년간 네덜란드는 OECD 국가 중 가구 부채 비율이 가장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시트콤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이 공동체가 퇴거 최후통첩을 받고 떠날 준비를 하는데, 참여자들의 결정으로 시트콤의 형식을 깨고 일종의 실재계와 같은 상황이 등장한다. 이들이 나누는 대화는 스콰팅 실천에 대한 공통의 애정, 정치적인 힘의 한계에 대한 회한과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한편, 시트콤 형식의 타파를 통해 제작 과정에 따른 고군분투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비극적이면서도 희망스런 결말을 갖는다.
GDR에서 <우리의 자율적 삶?>과 같이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작업한 또 다른 예로 그룹 프로젝트 <Ask! Actie Schonen Kunsten>도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Schonen Kunsten”는 네덜란드어로 순수예술fine arts과 청소예술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다. <Ask!>는 철학자, 디자이너, 미술사학자, 큐레이터 등이 모여 결성한 그룹으로, 이들 문화생산자와 이주 가사노동자 사이의 연대 가능성을 위한 프로젝트 그룹이다. 관련 모임에서 우리가 패널로 참여하거나 워크숍을 할 때면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했다. 과연 문화생산자의 (소위) 불안정한 삶과 이주노동자로서 불법적으로 삶을 이어가는 이주 가사노동자의 불안정한 삶을 동일시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응답 중 하나는 불안정의 정도에 대해서 조차 경쟁해야 하는가 하는 반문이었다. 그리고 공통성을 열거하는 것이다. 가령, 예술적 활동도 청소나 가사 노동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속의 (서)유럽 사회에서 점점 가치 절하되거나 혹은 시장의 논리에 휘둘리고, 문화생산자와 이주 가사노동자 모두 가사노동의 정치적, 생태적 가치를 믿으며, 또한 공통적으로 미적 가치에 헌신한다.
박가희 정치적 실천인가 혹은 실험인가?
최빛나 가능성을 위한 실험인 동시에 늘 한계를 마주할 수 있는 실천이라고 답하고 싶다. 한계를 자각하면서 또 다른 실험도 혹은 실천도 가능해진다. 한국의 80년대 민주화 운동도 사회의 온갖 반체제적인 그룹들이 모여 덩어리를 만들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즉 이질적인 집단들이 어떻게 공동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그 운동의 힘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어젠다 혹은 이익에 바탕을 둔 집단성이 변화를 이루어 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나는 역시 이런 개별화 보다는 서로 다른 어젠다를 공동화하는 것에, 미술 혹은 예술적 상상력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자율적 삶?>이나 <Ask!> 각각 급진적인 현 상황에 응답한 프로젝트이지만, 스쾃의 재합법화라든가 혹은 이주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 권리를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과대망상이 아니었을까.
박가희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사회를 변혁하거나 전복하려 하기 보다, 문제가 되는 가치나 태도에 화두를 던지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본다.
최빛나 담론과 실천, 문화적 변화나 사회변혁 사이에 뚜렷한 경계를 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둘을 모호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끊임없이 가로지르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 양 지점이 이편과 저편이 아니라 서로를 품는 양상으로 상상해야 한다. 가령 정부가 바뀌면서 매 2년마다 카스코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던 몬드리안 재단의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었을 때 우리가 행한 저항을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누구든 나와 상관 없다고 생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본인에게 구체적인 사안이 되어 다가오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우리에게도 왔다. 당시의 저항이 단순히 카스코에 고용된 9명의 파트타임 직원들, 혹은 카스코가 지원하고 함께 하는 실천 위주의 작가들의 ‘밥줄’을 지키는 것에 머물렀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의 힘으로 다시 받게 된 지원은 카스코라는 공간이 지향하는 가치와 문화를 지켜낸 것과 다름 아니고, 그 문화는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에 저항하는 에너지를 담고 있다. 또, 가사노동자들에게 보낸 우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동자로서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지위는 얻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운동의 발전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고 믿는다. 투쟁과 실천이 확신과 공통체 속 다양성differentiation in common이라는 방식으로 지속되는 한 움직임 역시 지속되고 그 움직임이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 지점이 언젠간 올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관념이 필요하다.
박가희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에 진행되는 활동들과 일상의 실천들 (직업과 일상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기는 하지만)이 매번 다른 이슈로 나타나지만 결국 그것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 작동하게 하는 문법은 같은 것이라 느껴진다. 결국 한 개인의 태도와 접근이 비정치의 정치성이면서 정치의 비정치성으로 그 움직임을 유효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최빛나 물론 GDR 안에서 <우리의 자율적인 삶?>과 같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술적, 미학적 효과는 물론 정치적 효과 혹은 강도에 대한 의심의 순간들이 없지 않았다. 특히 2011년 중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크레인 점거농성을 그가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접한 후 그랬다. 전형적인 노동 투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살 수 없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화초를 가꾸고, 그림도 걸어 놓고, 이불을 빨고, 운동도 하는 등의 ‘삶’을 일궈낸 투쟁으로, 그는 기존에 없는 노동운동과 시민 및 기타 여러 단체 등과의 연대와 소통의 움직임을 일으켜 냈다. 진정한 “Grand Domestic Revolution”은 그가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워졌다. 그러나 곧 네덜란드의 GDR이 김진숙의 행동과 한 궤도에 있다는 자각도 들었다. 물론 그런 자각에 안주할 수는 없었고, 이후 그를 찾아가 만나고, 그의 투쟁의 장에 방문하며, 또 그의 투쟁을 알릴 전시 및 다른 기회를 열어 보기도 했다.
박가희 오큐파이 운동이 한국에서는 미비하지만 존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역시 사회적으로는 별로 여파를 미치지 못했다. 점거와 삶 혹은 주거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에서는 오큐파이보다는 두리반 운동이 좀 더 한국적인 점거 운동이었다고 생각된다.
최빛나 두리반이 좋은 예다. 그 운동에 가담했던 이들이 ‘희망버스’ 운동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투쟁과도 관련이 있다. 아시아는 점거나 투쟁의 양상과 시기가 서로 다른 것 같다. 2013년 대만에서는 중국과의 FTA 비준에 저항하며 대학생들이 국회를 점거하는 ‘해바라기 시위’가 있었고, 2014년 홍콩에서는 ‘우산 혁명’을 주목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재구성하려는 어떤 혁명적인 일들이 패배감과 절망을 불러오는 수많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다. 오큐파이가 왜 한국에는 부재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다르게’ 펼쳐지는가의 차이를 지각하고 생성해 나가자고, 그리고 그 차이들의 공존 형식을 구성해 나가자고 말하고 싶다.
거실 안, 밥상 앞의 혁명 조직
분량9,201자 / 20분 / 도판 3장
발행일2015년 1월 15일
유형인터뷰
『건축신문』 웹사이트 공개된 모든 텍스트는 발췌, 인용, 참조, 링크 등 모든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용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의 출처 및 저자(필자) 정보는 반드시 밝혀 표기해야 합니다.
『건축신문』 웹사이트 공개된 이미지의 복제, 전송, 배포 등 모든 경우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