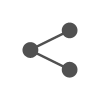‘지금, 한국성’, 더 비기닝
김상호
분량2,446자 / 5분
발행일2022년 9월 30일
유형서문
‘한국성’의 출현은 이렇다. 2021년 봄 다음 공모전 구상을 시작하면서 수년째 공모전 운영 매니저를 맡아온 김보현 씨에게 혹시 탐구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는지 물었다. 그는 문화기획자이자 큐레이터이기도 한데 스스로 건축에는 문외한으로 여겨 답을 저어하다가 며칠 뒤, 건축의 ‘한국성’이 궁금하며 사실 자신의 오랜 관심사라고 했다. 뜬금없다고 생각하면서 ‘건축상 주제 후보’라는 제목의 메모장에 ‘한국성’을 타이핑해 넣었다. 거기엔 이미 뜨문뜨문 메모해둔 그럴듯해 보이는 대여섯 개의 후보가 적혀 있었다. 그 후 메모를 종종 펼쳐보던 어느 날, ‘안 될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묵고 철 지난,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것 같은 그 단어가 그렇게 다시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고, 어느새 나도 궁금해졌다.
조짐은 있었다. 위대한 BTS가 5년 연속 세계 음악계에서 기염을 토하고 있었고, 이날치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범 내려온다>가 팬데믹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온갖 미디어 구석구석을 훑어내리듯 소비됐고, 봉준호의 <기생충>에 이어 <미나리>의 윤여정이 영화계의 화제였다. 대중문화 영역뿐 아니라 정치, 기술, 의료 영역에서도 글로벌 ‘K’의 존재감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진 시점이었다. 산발적이고 더디고 미약하나마 건축계에도 K의 기운은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한국관이 황금사자상을 수상했고, 케네스 프램튼이 <현대 건축: 비판적 역사> 다음 개정증보판에 ‘드디어’ 한국 건축가를 기술한다는 사실에 가까운 소문이 났고, 개인 애호가, 연구자에 이어 건축가들도 이름 없는 한국 건(축)물들의 버내큘러적 요소들을 탐미했고, 건축계 선두 그룹의 몇몇 중견 건축가가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적인 미를 자기 이론화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뚜렷이 목격된 일련의 증후와 그 잔향 속에서 ‘한국성’을 떠올렸고, 선택했다.
주제를 정한 초기에는 내가 연결시킨 원초적이고 유치한 아이디어들이 뒤섞여 있었다. 예를 들면, 각종 비엔날레나 엑스포 때마다 등장하는 ‘한국관’을 설계 과제로 삼거나, 디자인 심의를 필히 거치게 되어 있는 한옥보존지구에 한옥 없는 신축 건물을 설계해본다는 식이었다. 전자는 한국성이라는 표상을 건축화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한중일(특히 일본)이라는 속박에서 탈출(혹은 극복)하고, 종국에 가서는 프리츠커상이라는 개인적/국가적 욕망과 연결된다. 후자는 전통건축과의 정면대결로, ‘전통과 현대’ 혹은 ‘보존과 개발’이라는 고루한 이분법의 결투장에 균열과 파열을 내보려는 반역심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떠올렸던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건축의 어두운 포스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행히, 한국성이라는 주제는 여러 차례 토론과 회의를 거쳐 ‘지금’에 닻을 내렸다. 하나의 한국성이나 영원한 한국성에서 벗어난 지금의 한국성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의 위험 요소(선입견)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바로 ‘버내큘러’다. 주제 설정 당시나 글을 쓰는 지금이나 이것이 적합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아우러지고 의미는 통한다. 제목이 ‘지금, 한국성’으로 최종 낙점되기 전, 초안은 ‘한국의 버내큘러’이기도 했다. 내 머릿속에 이 말이 각인된 것은 <등장하는 건축가들> 첫 시즌에 건축가 김효영을 초대했던 포럼 자리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건축비평가 박정현이 김효영에게 건넨 ‘비평의 언어’ 속에 들어 있었고, 그날 모처럼 참석했던 건축가 서재원에게도 동시에 전달되었을 것이다. 심사위원은 그때 그렇게 운명처럼 정해진 채로 호명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른다.
왜, 또, 지금, ‘한국성’이냐. 작년 이맘때 주제를 발표했을 때나 얼마 전 연계 포럼을 마쳤을 때나 들었던(듣게 되리라 예상한) 질문이었다. 예상했던 바였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았고, 더 많은, 더 깊은 질문을 받아보지 못한 것이 오히려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공모전과 포럼 끝에 든 생각은, 건축계(넓게는 문화예술계)가 이 논쟁을 ‘제때’ 끝장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숙제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진작 일단락되었어야 했던 문제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 도전, 실천 없이 그 질문을 그 정도(이 정도)에서 멈추면, ‘한국성’은 영구 미제로 남아 우리를 영원히 괴롭힐 것이 분명하다. 언제 어디선가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물을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내놓을 답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답이 하나이거나 고정된 것일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대답할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타자의 시선, 외부자의 시선에 기대어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던’ 한국성을 정확하게 포착해낸 양 대서특필하며 웃고 떠들 것 같다. 그러니 그것이 나의 한국성이든 우리의 한국성이든, 과거의 한국성이든 지금의 한국성이든, 더 이상 그 문답이 필요 없어지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이야기다. ‘한국성은 돌아온다.’
김상호 정림건축문화재단 실장
‘지금, 한국성’, 더 비기닝
분량2,446자 / 5분
발행일2022년 9월 30일
유형서문
『건축신문』 웹사이트 공개된 모든 텍스트는 발췌, 인용, 참조, 링크 등 모든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용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의 출처 및 저자(필자) 정보는 반드시 밝혀 표기해야 합니다.
『건축신문』 웹사이트 공개된 이미지의 복제, 전송, 배포 등 모든 경우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