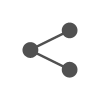포럼 현장을 바라보며
김보현
분량2,351자 / 5분
발행일2022년 9월 30일
유형에세이
“이번 발제 제목은 ‘한국미론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국미론은 실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깡통 발제인 셈이지요.”
포럼 <‘지금, 한국성’에 대하여>의 첫 번째 세션을 열며 민주식 교수가 가볍게 던진 농담에, 이번 포럼, 그리고 그 모태가 된 정림학생건축상 2022의 특징이 묵직하게 담겨 있다. ‘한국성’이라는 주제를 공모전의 형식으로 이끌어내기까지 주고받은 논의안에서 계속 맴도는 것은 미적인 측면과 윤리적 측면의 균형감이었다. 애초에 건축 공모전은 기능성(공간 설계의 효율성, 공간 프로그램의 상호작용 등)과 심미성을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주제로서 한국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한국성을 “미적인 측면 또는 양식”으로 이해해야 할지, 아니면 “한국 사회가 가지는 정신적 측면 또는 유무형적 가치”로 이해해야 할지 살피는 작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만일 한국성을 양식이나 심미성의 기준으로 이해한다면, 건축에서의 한국성에 대한 질문이 우리의 미학, 다시 말해 한국 미학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근대 학문인 미학이 한국에 소개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독일, 프랑스, 영미 미학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실낱같은 한국 미학의 명맥이나마 살펴보기 위해 민주식 교수님을 초빙하여 그가 연구하는 “한국미론의 실체”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건축의 한국성’이 미학이라는 샘에 녹아내리는 수용성을 가진 주제인가, 아니면 겉돌 수밖에 없는 지용성의 주제인가는 좀 더 살펴볼 문제였다. 이것이 수용성인가 지용성인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우리 안의 철학적 체계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따져 물어야 했다. 이는 주제 자체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앞서 고민했던 문제 “한국성을 한국 사회가 가지는 정신적 측면, 또는 유무형적 가치로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접근이기도 했다.
이병태 교수는 오랫동안 한국 현대 철학을 연구해온 연구 모임에서 ‘한국’, ‘현대’, 그리고 ‘철학’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지금의 용례로 남을 수 있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연구자다. 그리하여 그에게 유불선의 지적 전통을 벗어나 서구와 만나는 한국 철학사의 근현대적 전환에 대한 강의를 청하여 본 포럼에서 짧게나마 다뤄보고자 하였다. 이를 한 번이라도 짚어보아야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한국성을 논의한다는 것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이다.
그리하여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이야기 같고, 그래서 불필요한 엘리트주의적 담론처럼 여겨질지라도, 어떤 전환의 경계선 안에서 타자성을 벗어던지지 못했던 지점에 대하여 입을 떼는 한 걸음으로서 미학과 철학이라는 녹슨 칼을 꺼내든 셈이다. 한국 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훑으며, 한국 건축에서 자주 사용되곤 하는 ‘미적 가치’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개념이 본래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두루 살피고자 하였다. 한국 철학에서는 근현대 한국 철학의 전환기가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어떤 정체성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안티테제를 개괄해야 좀 더 수월한데, 19세기의 안티테제와 오늘날의 외부 권력을 이해해보는 계기로 이번 <지금, 한국성>이 구성되었다.
2022년 7월에 이루어진 두 번의 포럼은 뜨거운 관심과 함께 부족한 점 역시 드러내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애초에 각각 40분여간의 발제 안에서 두 세기에 걸친 학문의 변천사를 훑는다는 것이 오만한 태도였는지 모르겠다. 다만 이 시간을 함께한 분들에게 앞으로 더 깊이 알아볼 어떤 키워드 하나씩을 얻어가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그로써 충분하지 않나 하는 게으른 생각도 해본다.
포럼이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질문이 시작될 것이다. 건축의 한국성, 한국적 건축이 한국 미학과 철학 안에 녹아들어 가지 않는다면, 겉돌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발제를 맡았던 박정현 편집장의 논지처럼, 유럽과 나이지리아에서도 있었던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와 다를 바 없는 문제이므로 이 역시 한국 사회의 큰 틀 안에서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 본래는 급격한 근현대사의 풍파를 그대로 겪은 여타의 분야와 똑같았지만, 이제는 물과 기름처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면 동시대의 ‘한국 건축의 한국성’은 처음부터 새로운 카테고리를 성립할 자력이 있는가?
다시 돌아온 ‘한국성’이란 질문은 이처럼 꼬리를 무는 물음표를 잔뜩 짊어지고 있다. 역사는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잠시 멈춰 서서 질문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한국성’은 무엇인가? 왜 ‘지금’ 한국성을 이야기 해야 하는가. 바쁘디바쁜 현대 사회 안에서 진부한 해피엔딩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판 역시 열린 결말이다.
김보현 정림건축문화재단 팀장
포럼 현장을 바라보며
분량2,351자 / 5분
발행일2022년 9월 30일
유형에세이
『건축신문』 웹사이트 공개된 모든 텍스트는 발췌, 인용, 참조, 링크 등 모든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용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의 출처 및 저자(필자) 정보는 반드시 밝혀 표기해야 합니다.
『건축신문』 웹사이트 공개된 이미지의 복제, 전송, 배포 등 모든 경우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