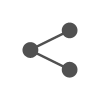‘보이지 않는 공공’을 드러내고, 자의식과 주체성을 환기하기
워크온워크 × 이경희
분량3,629자 / 7분 / 도판 2장
발행일2012년 4월 9일
유형인터뷰
예술가는 왜 도시로 나왔을까?
도시의 삶과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보다는 구축하기를 제안하는 예술가들이 있다. 도시공간이 하나의 정치, 경제논리의 수단으로 이해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Listen to the City의 박은선, 그리고 미술관, 갤러리에서 회자되는 ‘공공’의 의미를 미술 밖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Work on Work의 박재용, 장혜진 기획자. 예술이라는 이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지위와 수직적인 형태를 전복시키며 예술과 삶의 경계를 허무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워크온워크(Work on Work)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우연히 작업을 마주하게 하는 워크온워크(박재용, 장혜진)의 «흩어지는 전술».
인터뷰 이경희 정림건축문화재단 부팀장
이경희 지난 여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흩어지는 전술 HIT and RUN» (이하 ‘힛앤런’) 을 기획하고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였나요?
워크온워크 지원 당시 초기의 기획서에는 “형태학적 걷기의 한 연구”라는 지나치게 현학적인 타이틀을 잡았다. 시가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는 것도 결국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밖에서 해보고 싶었다. 대상은 일반 예술 관계자가 아닌 예기치 못한 일반 사람들이고, 참여 예술가도 밖에서 벌어지는 우연한 상황에 예기치 못하게 맞닥뜨린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한 사무실은 임시로 마련했고, 관련 자료들과 이해를 돕는 단서들을 가득 채워 넣었다.

이경희 공공성이라는 게 이제 현대미술에서는 눈에 띄거나 신선한 키워드도 아닌 것이 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직접 진행하는 여전히 낯설고 불안했을 듯 합니다.
워크온워크 진짜 두려움이 너무 컸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미술의 층이 두텁지 않다. 예술가들과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라는 존재를 아주 잠깐 나타나 알 수 없는 말을 떠드는 외계인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미술이라고 했을 때 그 공공이 과연 누구이며,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하는지. 그런 과정에서 ‘통제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작업들이 구체화되면서 처음 기획과 전혀 달라지기도 하고, 공공 공간만을 생각했는데 인터넷에서 한 예술가도 있고. 예상치 못한 작업들이 나와서 어떤 원칙이나 강령을 가지고 밀어붙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최소한의 조건상에서 예술가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모토로 말이다.
이경희 프로젝트 성격상 우연의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최소한의 예상 혹은 기대하는 범위가 있을 텐데, 전혀 다른 의도로 진행되는 경우를 두고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워크온워크 처음부터 예상했다. 결과는 둘째 치고라도 만약 작업에 대한 첫 제안이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는 모습들 면면을 다 공개하고 공유한다면 그 ‘실패의 기록’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작업 중에는 실패와 변경의 연속 속에서 오히려 엄청난 결과를 보여준 것도 있었으니까.
이경희 전시 기획의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술가들과 바깥에서의 작업이라니, 용감합니다.
워크온워크 사실 그때 작업이 완성된 게 하나도 없었다. 5월 첫 만남 때 예술가들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제안해 달라고 했는데, 다들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더라. 모두가 완성된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 뒤에 작품들의 콘셉이 점점 눈덩이가 커지듯이 커졌다. 사실 누구를 만날지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지만, 밖에 나가는 순간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은 완벽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작업이다” 라고 선언을 해도 보는 이들은 각자 마음대로 해석할 것 아닌가. 게다가 갤러리에 비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엄청 많아진다.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방향들이 두려웠다.

이경희 예술가들을 관리하면서 본인들은 중개자인가요, 관찰자인가요. 충돌의 조장을 즐기는 듯합니다.
워크온워크 가령, 예전에 했던 ‘미대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충돌을 조장해야 했다. 예를 들면 같이 활동했던 삼 형제가 모두 다른 지방의 미대를 다니다가 4년이 지나서 만났더니 미술에 대해서 모두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한 사람은 석공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개념미술가가 되어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극사실주의’가 최전선이라고 주장하더라. 도대체 4년 동안 이들이 뭘 배웠기에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궁금했다. ‘힛앤런’ 역시 서로 다른 예술가들을 충돌시키고, 미술 이외의 사람들과 조우했을 때의 상황을 관찰하고자 했다.
이경희 SNS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것들이 ‘현장감’, ‘즉흥성’, ‘예측 불가능’, ‘공공성’과도 모두 맥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워크온워크 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소셜’이라는 단어에서 회의를 느끼는 것 같다. 물론 처음부터 맹신한 것도 아니었지만. ‘힛앤런’을 진행하는 동안 트위터, 페이스북,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생각보다 매우 많았는데,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 싶을 만큼 현장에는 사람이 별로 오지 않았다. 왜 우리 임시 사무실에는 안 오는지, 사실 많이 외로웠다. (웃음)
이경희 왜 도시에 관심을 갖게 됐나요? 서울문화재단에 제출한 초기 기획서를 보면 공공성, 이동성, 아카이빙에 대해 언급했는데, (영어 제목도 Disappearing into the Crowd) 직접적인 계기라던가 당시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워크온워크 우선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공공, 이동, 아카이빙에 대한 ‘불만’에 근거한다. 공공이 어디에 있는가 봤을 때, 실체가 없지 않나. ‘1% 법’에 의한 작품들도 ‘어느’ 공공을 위한 건지. 그래서 생각한 게, “거꾸로 뒤집으면 어떨까. 아름답지 않은 걸 하면 어떨까” 였다. 근데 또 ‘힛앤런’이 공금을 사용하는 거니깐 책임을 갖고 공공에게 도움이 되긴 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동’은, 우리처럼 집이 없는 사람은 삶 자체가 이동이다. 예술가들도 대관료가 너무 비싸 뭘 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빙’ 문제만 봐도 (한숨) 어딜 가나 참 안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식이 쌓이지 않고, 했던 삽질은 계속되고. 그래서 일단 해보고, 나중에 잘 안 되더라도 개선점은 찾아볼 수 있겠지 했다. ‘힛앤런’이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액티비즘이 강한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면 ‘그래서 무슨 도움이 되었느냐, 너희가 하려는 게 도대체 뭐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걸 저항과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봤다. 현실에 무슨 반향을 일으켰냐고 따지면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조차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도 몰랐으니까 일단 하고 싶었다. 그래서 ‘힛앤런’은 그 전체가 일종의 리서치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경희 프로젝트를 끝낸 뒤의 소감을 부탁합니다.
워크온워크 우리가 굳이 밖에 나갔던 이유는 ‘지금 꼭 해야겠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지금의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곳에서 ‘공공’의 의미는 모호하고 왜곡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실험 해보고 싶었던 것 같다.
‘보이지 않는 공공’을 드러내고, 자의식과 주체성을 환기하기
분량3,629자 / 7분 / 도판 2장
발행일2012년 4월 9일
유형인터뷰
『건축신문』 웹사이트 공개된 모든 텍스트는 발췌, 인용, 참조, 링크 등 모든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용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의 출처 및 저자(필자) 정보는 반드시 밝혀 표기해야 합니다.
『건축신문』 웹사이트 공개된 이미지의 복제, 전송, 배포 등 모든 경우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